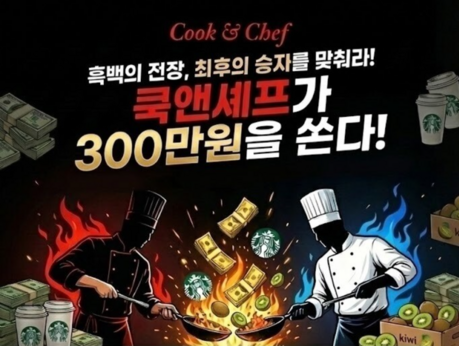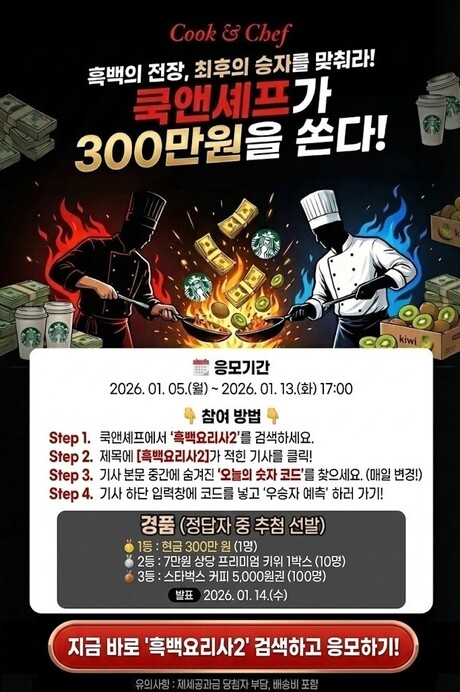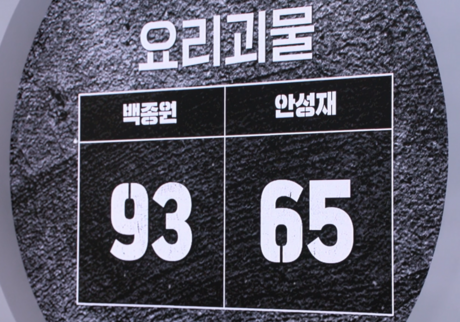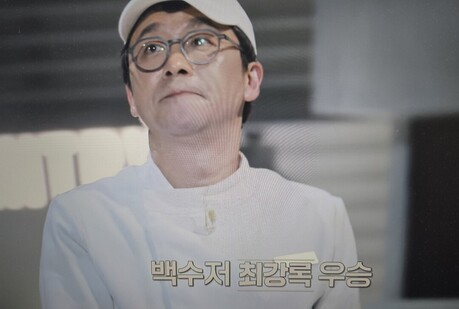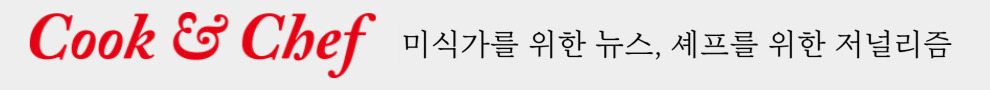[Cook&Chef = 이경엽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 한 제빵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무하던 12년 차 여성 노동자는 6일 연속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상”으로 결론내렸지만, 동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12시간 맞교대 폐지’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SPC의 새로운 교대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되풀이되는 ‘노동의 재포장’이 있었다.
‘8시간제’라는 허상, 노동강도 재배치
2022년 10월, SPC 계열사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듬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회사는 “12시간 맞교대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속 조치는 ‘개선’이라기보다 ‘재배치’에 가까웠다. 기존 하루 12시간씩 주 5일 일하던 구조를 하루 8시간씩으로 줄이는 대신, 근무일을 주 6일로 늘린 것이다.
야간조와 오후조 전환 시에는 오전 7시 30분에 퇴근해, 오후 3시에 다시 출근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근무표가 나왔다. 실제 노동자들이 확보한 휴식 시간은 오히려 짧아졌다. 형식상 근로시간 단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일수 증가와 수면시간 축소, 생체 리듬 붕괴가 동반됐다. “근로기준법은 지켰지만, 인간의 생체리듬은 무너졌다”는 노동계의 지적은 과장이 아니었다.
SPC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근무환경 개선”, “피로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의 초점은 ‘생산량 유지’에 맞춰졌다. 노동자가 아닌 라인의 효율이 성과의 기준이 된 것이다. 8시간제의 표준 근무표에는 실제 피로 누적, 체온·혈압·수면 등 인체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고, ‘휴식 시간’은 단순히 숫자상 여백으로 처리됐다. 노동은 교체 가능하고, 인간은 시스템의 부품처럼 취급됐다.
반복되는 죽음, 멈추지 않는 공정
SPC그룹에서 일어난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23세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건 이후에도 계열 공장에서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는 이어졌다. 정부의 특별감독과 언론의 집중보도에도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안전수칙 미준수’가 아니다. 생산성과 인력 구조의 불균형, 하청과 본청의 책임 분리, 효율 중심의 근무표 설계라는 구조적 결함이 쌓여 있는 것이다. 한 노동자는 “우리한테는 일의 속도가 생명인데, 역설적으로 그게 진짜 생명을 깎아요”라며 현장을 설명했다.
이 구조적 결함 속에서 SPC의 생산라인은 24시간 돌아간다. 빵이 굽혀지고 포장되고 출고되는 동안, 누군가는 퇴근을 미루고, 누군가는 휴식 대신 동료의 빈자리를 메운다. 그 리듬은 너무 빠르다. 빵은 타이밍을 놓치면 버려지지만, 사람의 피로는 계산 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망은 ‘노동자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식품산업 전반의 구조적 피로 누적을 드러낸 사건이며, 시스템의 표준이 된 ‘과로의 일상화’에 대한 경고다.
식탁 위의 빵, 그 밑의 노동 윤리
우리는 빵을 문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문화는 사람의 손과 시간이 만든 결과다. 그 손이 무너지고, 그 시간이 생명을 갉아먹는다면 그건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생산 프로토콜이다. 제빵산업은 한국 외식문화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상징의 밑면에 노동의 윤리 붕괴가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다시 특별감독을 예고했고, SPC는 또다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빵처럼 부풀었다가 식어버리는 대책’으로 끝날 것이다. 음식은 문화다. 그렇다면 노동은 그 문화를 지탱하는 토대여야 한다. 이 죽음이 남긴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한국의 식탁은 결코 안녕할 수 없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