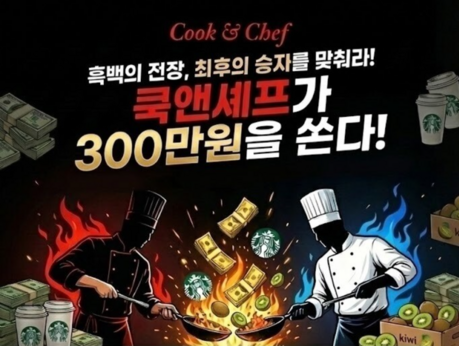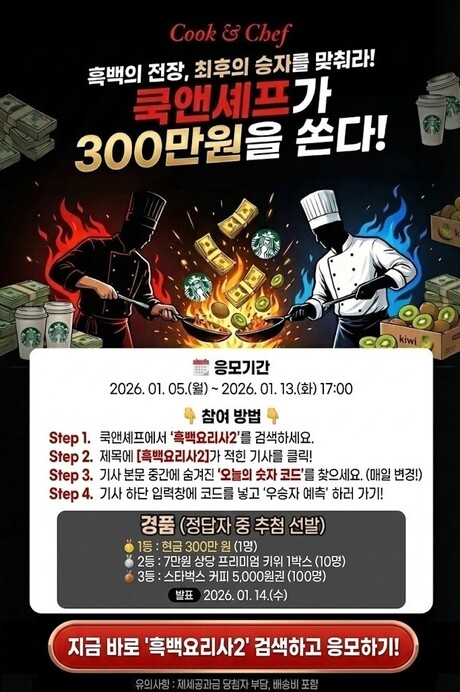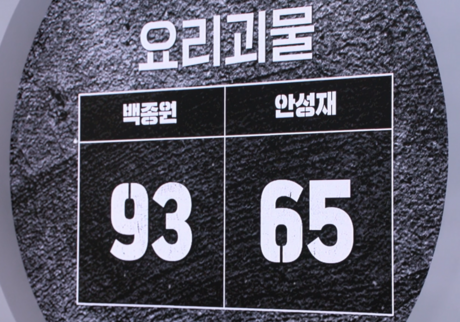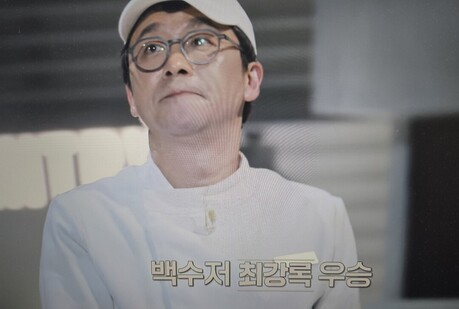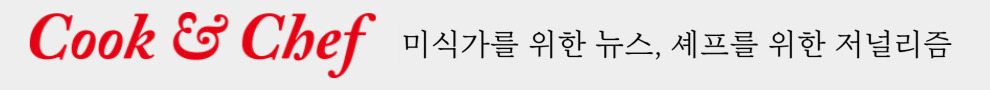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오늘(8일)은 “찬 이슬이 내린다”는 뜻을 가진 절기 한로(寒露)다. 추분과 상강 사이,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는 농촌의 타작이 한창이고, 들판은 곡식과 열매로 가득하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낮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밥상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달라진다.
24절기 중 하나인 한로에는 특별한 민속행사가 전해지진 않지만, 오곡백과를 수확하고 제철 음식을 나누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풍속이 이어졌다. 특히 추어탕, 호박, 국화전은 한로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상징적 음식이다.
찬 이슬의 계절, 한로의 의미
한로는 가을 기운이 무르익고 초목에 이슬이 맺히는 절기로, 농가에선 “무서리 세 번에 된서리 온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바쁘게 추수를 마무리했다. 벼, 콩, 고구마, 들깨, 팥 등은 이때 거두어야 하고, 다음 해를 위한 밀과 보리 파종도 서둘러야 했다.
철새의 이동도 한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름새인 제비는 강남으로 내려가고, 겨울새인 기러기가 북에서 날아온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변하는 절기의 전환점이었던 것이다.
문헌에 따르면 한로 전후에는 국화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 국화전을 부치거나 국화주를 담그며, 높은 곳에 올라 수유 열매를 꽂아 잡귀를 물리친다는 풍속도 전해진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절기 인식을 넘어, 계절의 전환을 몸과 음식으로 느끼며 대비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몸을 덥히는 가을 보양식, 추어탕
한로 무렵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단연 추어탕이다. 벼를 수확하기 전 논물을 빼면 미꾸라지가 땅속으로 파고드는데, 이때 잡은 미꾸라지를 ‘추어(鰍魚)’라 했다. 깊은 영양을 머금은 미꾸라지를 푹 고아 끓인 추어탕은 “가을철 으뜸 보양식”으로 불렸다.
지명순 작가는 『당신의 식사는 안녕하십니까』에서 “미꾸라지를 푹 고아 만든 추어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되며 체력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가을철 보양식의 대표주자다”라고 적는다.
추어탕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뚜렷하다. 영남식은 된장 육수에 갈아 넣은 미꾸라지, 배추우거지, 속대를 더하고 산초로 향을 잡아 담백하고 깔끔하다. 호남식은 토란대, 고사리 등 재료가 화려해 육개장처럼 푸짐하다. 공통점은 들깨를 넉넉히 갈아 넣어 국물에 고소함을 더한다는 점이다.
추어탕은 단순한 보양식을 넘어 신뢰의 음식이기도 했다. 최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보도되며, “믿을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로의 추어탕은 결국 제철 재료를 정직하게 다루는 마음에서 진짜 보양식이 완성됨을 일깨워준다.
달달한 온기, 호박과 호박죽
호박 역시 한로 무렵 빼놓을 수 없는 제철 식재료다. 여름을 지나 가을 햇살을 듬뿍 머금은 늙은호박은 달달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겨울철 영양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지명순 작가는 같은 책에서 “늙은호박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되어 겨울철 영양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수분과 칼륨이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에 뛰어나 산모에게 좋은 것은 물론이다”라고 회고한다.
호박죽은 과거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음식이었지만, 현대에는 우유, 견과류, 단호박 등을 곁들여 수프처럼 재해석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호박을 말려 만든 호박고지는 저장성과 활용도를 높여 겨울 내내 귀한 영양을 공급했다.
늙은호박은 그 자체로도 집안을 장식하는 상징물이었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호박죽을 나누는 일은 겨울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온기를 상징했다.
국화의 향기, 국화전과 국화주
한로 즈음에는 국화가 절정을 맞는다. 국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장수를 기원하고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때 부쳐 먹던 국화전(菊花煎)은 노란 국화잎을 넣어 고소한 전병처럼 즐겼고, 국화주 역시 절기의 기운을 몸속에 들이는 의례적 술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로를 전후하여 국화전을 지지고 국화술을 담그며, 온갖 모임이나 놀이가 성행한다”고 기록한다.이는 단순한 음식 행위가 아니라, 계절의 변화와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작은 의례였다. 가을 국화 향을 입안에 머금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다.
한로의 밥상은 단순히 제철 식재료를 먹는 데 그치지 않았다.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다가오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추어탕의 단백질, 호박의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국화의 약리적 성분까지 모두 “찬 기운을 막고, 따뜻함을 채우는 음식”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로를 잊고 지나치기 쉽지만, 절기의 지혜를 되살린다면 일상의 밥상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다. 지역 농산물로 정직하게 끓인 추어탕, 건강식으로 재해석한 호박죽, 전통주의 맥락에서 즐기는 국화주 한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계절과 사람을 잇는 문화의 매개체다.
한로는 그저 달력 위의 한 칸이 아니다. 들녘에서 곡식이 익고, 하늘에서 철새가 바뀌며, 밥상에서는 제철의 맛이 오르는 시기다. 추어탕 한 그릇, 호박죽 한 숟가락, 국화전 한 입에는 모두 찬 이슬이 내리는 계절을 살아낸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다.
절기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절을 기억하는 방식이며,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언어다. 올해 한로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국 한 그릇, 달달한 호박죽, 향기로운 국화전으로 계절의 지혜를 맛보는 것은 어떨까.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