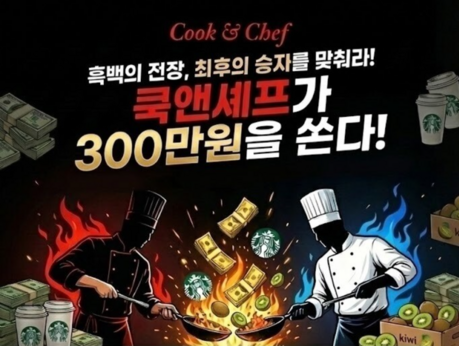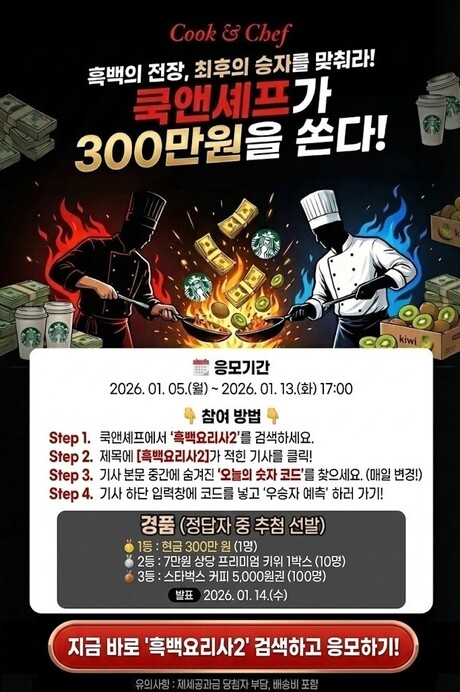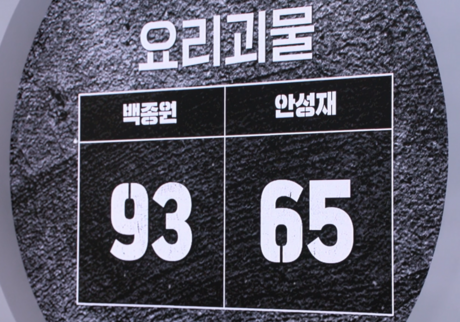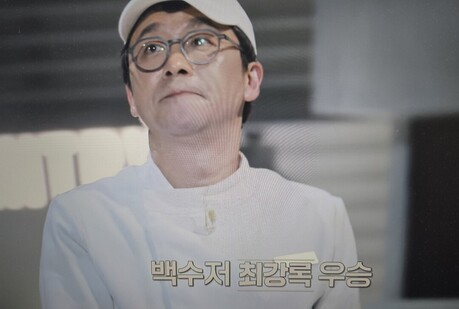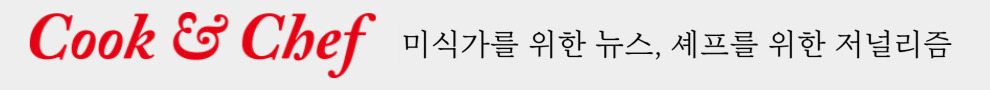소득이 만든 식탁의 격차, 건강한 한 끼가 불평등을 줄인다
![[픽사베이]](https://cooknchefnews.com/news/data/2025/10/10/p1065583918514924_479.jpg)
[Cook&Chef = 송채연 기자] 한때 비만은 풍요의 상징이자 부의 증거였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살집 있는 몸은 넉넉한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가난할수록 비만하다’는 말이 통계로 입증되는 시대가 되었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비만 유병률은 31%였지만 하위 20%는 38%에 달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슷했던 수치가 코로나19를 거치며 점점 벌어졌고, 지금은 소득 수준이 곧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저소득층일수록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2024년 소득 하위 1분위의 비만 진료 인원은 1,243명으로, 상위 10분위(3,425명)보다 2.76배 적었다. 치료비는 오히려 더 높았다. 하위 1분위의 1인당 진료비는 135만 6천 원으로 상위층보다 1.45배 높았지만,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낮았다. 결국 치료는 늦어지고, 합병증 위험은 커지며, 의료비 부담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빈곤이 식탁을 바꾸고, 식탁이 몸을 바꾼다
저소득층의 높은 비만율 뒤에는 ‘식생활의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식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아질수록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열량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된다.
라면, 튀김, 탄산음료 등 저렴하고 빠른 식사가 반복되면 체중은 빠르게 늘고,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서 대사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간다.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 섭취는 줄어들어 장 건강이 나빠지고 포만감이 낮아져 과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고소득층은 신선한 식재료와 질 좋은 단백질,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에서도 유리하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는 ‘얼마나 버느냐’와 직결되고, 음식의 질은 건강의 격차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건강한 한 끼가 만드는 변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해답은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집밥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와 건강 증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밥을 지을 때도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을 섞어 먹고,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3가지 이상 올리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다. 튀김보다 찜이나 구이, 볶음보다 데치기·무침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비만 예방법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 교육, 건강 식재료 지원, 지역사회 공공급식 확대 같은 정책이 병행된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난이 건강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다.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식탁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차이는 결국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신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구나 건강한 식탁 앞에 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다. 그 한 끼의 변화가 개인의 몸을 바꾸고,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
Cook&Chef / 송채연 기자 cnc02@hnf.or.kr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