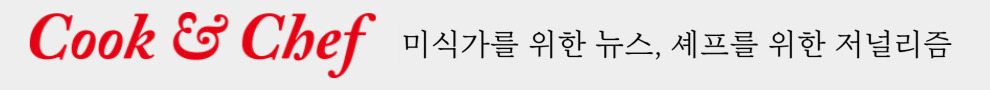[Cook&Chef = 이경엽 기자] 12월 10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 3층 에메랄드룸. '제16회 외식산업인의 날' 행사장은 입구부터 화려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전국 각지의 외식 경영주들과 내빈들이 인사를 나누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K-푸드 세계화'와 '비상(飛上)'이라는 희망찬 슬로건이 번쩍였다. 호텔 셰프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찬 코스 요리가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정작 그 테이블에 앉은 외식업주들의 표정은 머리 위 샹들리에 조명만큼 밝지 못했다.
본지는 이날 행사장에서 10여 명의 외식업주, 프랜차이즈 관계자, 주방 설비 기업 임원들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식 행사장 밖에서 들은 현장의 공기는 'K-푸드 열풍'이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외식업자들은 하나같이 "올해는 버틴 것 자체가 기적"이라며, 이미 한계점까지 몰린 내수 시장의 참혹한 현실을 토로했다.
"오리 원가 5천 원→7천 원 폭등…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 굳어져"
행사장에서 만난 한국외식산업협회 성남시지회 소속의 오리 전문점 운영주 A씨(60대)의 손은 거칠었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그는 기자의 명함을 받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말도 못 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쓰는 오리 고기 원가가 5천 원이 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7천 원대로 올랐는데 내릴 기미가 안 보여요."
A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원가 상승의 공포를 설명했다. 재료비가 40% 가까이 폭등했지만, 메뉴판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손님들 주머니 사정도 뻔한데 가격을 1천 원, 2천 원 올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 올리는 순간 발길이 끊길 게 뻔하다"며 "결국 그 손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말이 엄살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고개를 저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보쌈 전문점 경영주 B씨 역시 씁쓸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그는 "요즘에는 밥만 먹고 살자, 있는 건 안 까먹자는 심정"이라며 "옛날에는 장사해서 자식들 키우고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늘도 가게 문 안 닫고 버텼다'는 심정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40년 외식 외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은 생존의 공포 앞에 희미해져 있었다.
"책상물림 정책에 분통… 디지털 소외감에 두 번 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불신도 팽배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를 잡겠다고 발표하고 각종 지원금을 내놓지만, 현장 상인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한 참석자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업자들이 그런 걸 피부로 느끼지, 월급쟁이들이 뭘 알아요"라며 피부에 와닿지 않는 탁상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고령의 자영업자들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소외감을 호소했다. 정부 지원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같은 디지털 기기 도입이나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집중되다 보니, 기계를 다루는 데 서툰 고령층 업주들은 신청조차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
논산시지회 부지회장 C씨는 "젊은 친구들이나 정보 빠른 사람들은 지원금 쏙쏙 빼먹는데, 우리는 신청하는 법도 몰라서 '그림의 떡'이다. 15평 가게 하나 차리는데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몇천만 원 대출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주방 설비 업체도 "내수엔 답이 없다"
비명은 골목상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후방 산업인 설비 업체들의 진단은 더욱 냉정하고 구조적이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놀부' 가맹사업팀 전주명 팀장은 "대기업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외식업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주방 설비 및 유통 업계의 시각도 엇갈렸다. 주방용품 전문 기업 '주방뱅크'의 이연숙 상무는 "국내 경기가 침체돼 있는 건 맞다. 다른 주방 업체들은 되게 힘들다고 한다"면서도 "저희는 10년 전부터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하고 해외 수출 비중을 높여서 버티고 있다. 만약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오프라인 영업만 고집했다면 장담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탈(脫) 내수'를 선택한 곳뿐이라는 서늘한 증언이었다.
화려한 호텔 조명 아래에서 'K-푸드 세계화'가 외쳐졌지만, 그 뿌리를 이루는 외식업 현장은 한파에 가까운 혹독한 현실을 견디고 있었다. 외식업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조리·노동·공간·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유기적인 생태계다. 현장의 절규가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 생태계의 붕괴가 지속된다면, K-푸드의 성장은 모래성 같은 허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