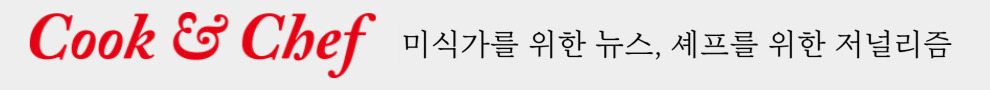보양식보다 가볍고, 영양제보다 자연스러운 한 그릇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송자은 전문기자] 겨울이 깊어질수록 식탁은 자연스럽게 국물 쪽으로 기운다. 차가운 바람에 움츠러든 몸은 따뜻한 온기와 함께, 소화가 쉽고 부담 없는 음식을 원한다. 그럴 때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선택되는 식재료가 있다. 전라도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겨울 해조류, 매생이다. 실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이 녹색 해조류는 오래전부터 ‘별미’로 불려 왔지만, 그 진짜 가치는 맛보다 몸을 회복시키는 힘에 있다.
임금의 수라상에서 오늘의 집밥까지
매생이는 단순한 제철 식재료가 아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이미 귀한 음식으로 기록돼 있다. 전남 해안에서만 자라던 특산물인 매생이는 임금에게 진상되던 해조류였고, 선비들의 글에는 “누에 실보다 가늘고, 국을 끓이면 부드러워 엉키되 흩어지지 않는다”고 묘사돼 있다. 뜨거운 국물 속에서도 결을 잃지 않는 이 특성은, 매생이가 왜 ‘국’이라는 형태로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설명한다.
지금의 매생이는 더 이상 왕의 식재료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겨울이면 남도 식탁의 중심에 오르고, 매생이국 한 그릇은 계절의 신호처럼 여겨진다. 전복이나 장어 같은 고가의 보양식이 아니어도, 매생이는 충분히 몸을 살핀다.
매생이를 ‘가벼운 음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영양의 밀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칼로리와 지방은 낮고,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풍부하다. 특히 칼슘과 철분 함량은 다른 식물성 식재료와 비교해도 눈에 띈다. 뼈 건강이 신경 쓰이는 중년 여성이나 성장기 아이에게 매생이가 자주 권장되는 이유다.
여기에 아스파라긴산을 비롯한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이후 매생이국을 찾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몸속에 쌓인 피로 물질을 정리하고,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다시 돌려놓는 데 매생이는 적합한 재료다.
식이섬유 역시 매생이의 강점이다.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유익균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준다. 면역 기능의 상당 부분이 장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생이는 겨울철 면역 관리 식재료로도 의미가 크다.
‘궁합’이 만드는 시너지, 매생이의 쓰임
매생이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함께할 때 진가가 배가된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굴과 만나면 겨울철 영양 균형이 한층 단단해진다. 매생이의 알칼리성 성질은 돼지고기처럼 산성 식품과도 잘 어울려,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돕는다. 그래서 남도에서는 매생이를 ‘조연’이 아니라, 음식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재료로 다뤄왔다.
조리법 역시 매생이의 성격을 닮아야 한다. 열에 민감한 만큼 오래 끓이기보다는, 육수를 낸 뒤 마지막에 넣어 짧게 익히는 것이 좋다. 과도한 조리는 식감뿐 아니라 영양 손실로 이어진다. 무침이나 전처럼 가열을 최소화한 방식도 매생이의 장점을 살리는 선택이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과하면 부담이 된다. 매생이는 요오드 함량이 높은 해조류이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은 적정 범위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특유의 섬유질 구조로 인해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과다 섭취 시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건강한 식재료일수록 ‘꾸준히, 적당히’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매생이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 값비싼 보양식처럼 몸을 흥분시키지 않고, 자극적인 건강식처럼 부담을 주지 않는다. 대신 매생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의 균형을 회복시킨다.
겨울 바다는 거칠지만, 그 안에서 자란 매생이는 유난히 부드럽다. 실처럼 얇은 한 가닥에 담긴 영양은 생각보다 깊고 단단하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더’하려는 계절에, 매생이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충분하다고, 이미 바다 안에 답이 있다고.
추운 날, 국물 한 그릇이 필요할 때 매생이를 떠올리는 이유는 어쩌면 아주 단순하다. 몸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다.
Cook&Chef / 송자은 전문기자 cnc02@hnf.or.kr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