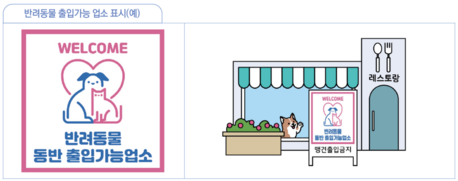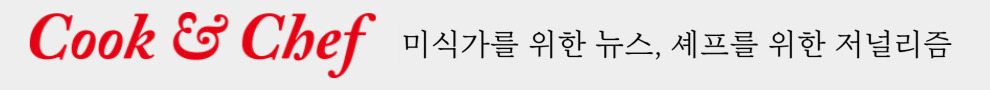[Cook&Chef = 서현민 기자] 분식집에서 “오뎅 하나 주세요”라는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어묵은 생선 살을 갈아 만든 가공식품이고, 오뎅은 그 어묵을 넣어 끓여 먹는 전골 요리의 이름이다. 우리 일상에서 두 단어가 뒤섞인 이유는, 어묵이 한국에 자리 잡은 과정과 시대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면 조금 더 분명해진다.
생선살을 곱게 갈아 찌거나 굽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전역에서 활용돼 왔다. 일본에서는 가마보코라는 음식으로 정착했고, 잔치나 의례 음식으로 쓰일 만큼 귀한 존재였다. 이후 공장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형태가 다양해졌고, 생활 식품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어묵이 파생됐다.

오뎅은 이 재료가 들어간 요리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두부와 곤약을 꼬치에 꿰어 된장과 함께 먹던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간장과 육수를 사용하는 전골로 바뀌었다. 무와 달걀, 다양한 어묵이 더해지면서 한 그릇 요리로 완성됐다. 포장마차와 함께 퍼져 나간 오뎅은, 바쁜 일상 속에서 몸을 녹여 주는 따뜻한 음식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에서 어묵과 오뎅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일제강점기다. 수산 가공 기술이 함께 들어오며 어육 제품이 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됐다. 해방 이후에는 값이 부담되지 않는 단백질 식품으로 자리 잡았고, 분식 문화가 퍼지면서 길거리에서도 쉽게 만나는 간식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국물에 담긴 꼬치 음식 전체를 “오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점차 재료의 이름까지도 같은 단어로 통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어묵 공장이 늘어났다. 판어묵, 튀김어묵, 찐어묵 등 제품이 세분화되었고, 가정에서도 쉽게 조리해 먹는 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오뎅국물”은 겨울이면 떠오르는 계절 풍경이 되었고, 어묵은 자연스럽게 대중의 기억 속에 스며들었다.

최근 들어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학교, 미디어를 중심으로 재료와 요리 이름을 구분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재료는 어묵, 요리는 어묵국 또는 어묵탕으로 부르는 방식이다. 지역에서는 어묵을 특산품으로 키우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부산과 통영의 수제 어묵이 브랜드화되고, 여행과 결합한 체험 상품으로 확장되는 모습도 눈에 띈다. 한편, 일본식 전골로서의 오뎅은 별도의 요리로 소개되며, 조리법과 스타일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단순하다. 어묵은 재료이고, 오뎅은 요리다. 그러나 이 단순한 차이가 만들어지기까지, 시대의 변화와 음식 문화의 상호작용이 겹겹이 쌓여 있다. 길거리 포장마차의 추억과 산업화의 흔적,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이야기까지. 익숙하게 불러 온 단어 뒤에는, 한 사회의 식탁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긴 여정이 담겨 있다.Cook&Chef / 서현민 기자 cnc02@hnf.or.kr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